[사회] 물 먹는 스펀지 도로의 비밀 "사막화 된 도시, 침수·열섬 완화"
-
5회 연결
본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의 한 이면도로에 설치된 투수블록. 천권필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 송파구 풍남동의 한 이면도로. 차량과 주민들이 쉴새 없이 오가는 이 길에는 독특한 헤링본 패턴의 블록이 깔렸다. 얼마 전 내린 비 때문인지 일부 블록들은 물을 먹은 듯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빗물이 블록의 공극(孔隙·비어 있는 틈)을 통해 흡수된 뒤 블록 내부에 뚫린 4개의 구멍을 타고 토양으로 내려가죠.” 수년 전 이곳에 투수(透水)블록을 설치한 업체의 백원옥 대표가 설명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의 한 이면도로에 설치된 투수블록(왼쪽)과 아스팔트에 같은 양의 물을 부었다. 투수불록은 1m 이내에서 물이 흡수된 반면, 아스팔트에서는 물이 빗물받이까지 흘러갔다. 천권필 기자
투수성을 비교하기 위해 투수블록과 바로 옆에 깔린 아스팔트 위에 같은 양의 물을 부었다. 투수블록의 경우 마치 스펀지처럼 물이 땅속으로 스며든 반면, 아스팔트에 부은 물은 흡수되지 못하고 5m 정도 떨어진 빗물받이까지 흘러갔다. 그는 “투수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의 30% 정도가 빈 공간으로 돼있다”며 “아스팔트는 불투수층이어서 빗물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막화된 서울…절반 이상이 불투수면적

강한 비가 내리는 17일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의 말대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는 여름철 도심 침수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도로 같은 불투수층이 도시를 점점 덮다 보니 극심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의 불투수면적은 53%로 절반을 돌파했다.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환경정보기술학과 교수는 “빗물이 토양으로 스며들 기회도 없이 하수구로 직행하면서 서울의 땅이 사막화되고 있다”며 “아스팔트 같은 불투수 포장은 빗물의 자연 흡수를 막아 도시 홍수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열섬 완화 효과도 “아스팔트보다 최대 10도 낮아”

충북 진천군의 한 학교앞 도로에 설치된 투수블록. 업체 제공
투수블록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고온 환경에서 투수블록의 표면 온도가 아스팔트 도로보다 최대 10도까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박대근 서울연구원 인프라기술연구실장은 “투수 기능이 있다 보니 증발산을 통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며 “색을 밝게 하는 방식 등으로 반사율을 높이면 온도를 더 떨어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들도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투수블록을 도입하는 추세다. 전북 전주와 충북 진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도뿐 아니라 차도에도 투수블록을 설치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로까지 확산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투수성과 내구성 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투수블록에서는 공극이 막히는 등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도에 사용되는 투수블록의 품질 기준을 점차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스펀지 도시’를 목표로 투수 면적을 늘리고 있다. 김 교수는 “프랑스는 2050년까지 국토의 40%를 투수화해 탄소 배출을 30% 감축하는 게 목표”라며 “불필요한 아스팔트 포장을 투수성 재료로 전환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도시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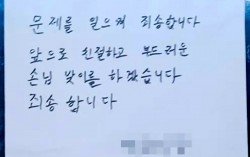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