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제유가, 4년만 최저인데…OPEC+ 증산 결정 배경은?
-
3회 연결
본문
국제 유가가 4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6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41만1000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하면서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16달러(1.99%) 떨어진 57.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도 1.06달러(1.73%) 내린 배럴당 60.23달러로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다.
이는 원유 공급 확대 가능성이 커져서다. 지난해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이행한 주요 산유국은 올해 4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3만8000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는데, 5월부터 두 달 연속 증산 폭(41만1000 배럴)을 더 늘리기로 했다. 증산분이 하루 96만 배럴에 달해, 하루 220만 배럴 감산에서 44%가 풀리는 셈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김영옥 기자
시장에선 이런 결정이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75~80달러 수준을 오가던 국제 원유가격은 현재 20%가량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유가 하락을 부추긴다. 호르헤 레온 라이스태드에너지 애널리스트는 AFP에 “석유 시장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자 OPEC+을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셈법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 이유는 OPEC+ 내부에서 벌어진 신경전이다. 할당량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사우디의 ‘응징’이라는 것이다. 앞서 2022년부터 OPEC은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감산 조치를 시작했다. OPEC이 생산량을 결정하면 나라마다 할당량이 배정되는데, 카자흐스탄과 이라크 등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며 할당량을 넘겨 원유를 생산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가 생산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경고를 반복했다”며 “카자흐스탄 등이 감산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은 11월 전에 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호르헤 레온 애널리스트도 “사우디 등이 수년 간의 감산 끝에 전략을 바꾸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린다는 결정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배경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약해왔는데, 사우디가 이에 화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에게 ‘저렴한 석유’라는 환영 선물을 주어 미국과 더 강력한 안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큰 야심을 품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어느 정도의 양보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증산 카드는‘양날의 칼’과 같다. 아부다비상업은행의 모니카 말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사우디 정부는 지출을 긴축하고 부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의 올해 재정 적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골드만삭스)이 나오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네옴시티 건설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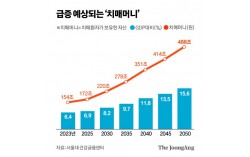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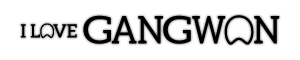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