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과학기술의 질주, 블록화 시대 한국의 선택
-
2회 연결
본문
얼마 전 방문했던 청두(成都)시 한 기관에 걸려있던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의 자원이며, 혁신은 제1의 동력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산 제품은 한국에서 ‘저렴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이미지가 강했다.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유행했고, 샤오미(小米)의 보조배터리나 미밴드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 인기를 얻었다. 반면 수교 이래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과 제품은 큰 사랑을 받았다. 한국 삼성 휴대폰은 시장점유율이 30%에 육박했고, 현대차는 일반 차뿐만 아니라 경찰차, 택시에 도입되며 중국 도로에서 흔히 보던 차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상황은 많이 바뀌고 있다. 요즘 한국 내 신혼부부와 가정주부들 사이에 필수 가전으로 떠오른 로봇청소기의 경우 중국의 로보락(Roborock)이 삼성, LG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로보락은 사용자 경험과 기술력에서 소비자 신뢰를 얻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한때 중국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삼성 휴대폰의 시장점유율은 1% 미만인 상황이고, 현대차 역시 중국 도로에서 자주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기존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과거 패스트팔로워(fast-follower,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로 불리던 중국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기술 선점에 도전하고 있다. 올해 초 공개된 딥시크(DeepSeek)는 미국 GPT 시리즈에 근접한 성능을 선보이며, 중국 AI(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을 각인시켰다. 이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 이차전지,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성장 속도와 폭은 놀라울 정도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4월),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기(5월), 로봇 축구 리그(6월) 대회가 잇달아 개최되었고, 8월에는 베이징에서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개최됐다. 이는 단순 기술 시연을 넘어 차세대 로봇 실증무대를 선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중국의 위상은 뚜렷하다. BYD(比亞迪, 비야디)는 2023년~2024년 기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고, 중국 닝더스다이(寧德時代, CATL)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바야흐로 중국은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기술 중심의 첨단 제조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괄목할만한 민간의 혁신 노력이 있다. 잘나가는 기업들은 신속한 개발 주기와 사용자 중심 설계 전략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 역할까지 수행하며 건강하고 탄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025년 8월 14일,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베이징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8월 13일에 열린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5대5 축구 예선전 모습이다. VCG
민간 기업의 혁신에 더하여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전략,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강화 정책도 한몫했다. 2006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2020)〉이 시행된 뒤 중국은 AI와 바이오 기술, 신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생태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인재 육성 체계이다. 베이징(北京)대학, 칭화(清華) 대학 등 명문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공학 중심 커리큘럼 개편, AI, 로봇, 소재과학 중심 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 도약은 국제 과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는 중국을 자연과학 논문 분야 1위로 평가했다. 특히, 세계 상위 10대 연구기관 중 8개가 중국의 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세계적 학술지에서는 중국 논문의 질적 수준이 미국, 유럽에 근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논문의 양적 확대를 넘어 기초 연구의 질적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꾸준히 과학기술 협력을 이어왔다. 공동연구, 신진과학자 교류 및 양국 장관 간 협의체인 ‘한중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간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 안보와 기술 주권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재설계해야 한다. 핵심 기술을 둘러싼 수출 규제와 공급망 재편은 과학기술을 외교와 안보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오랜 기간 세계를 이끌어온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흐름은 뚜렷하게 퇴조하고 있고, 대신 기술 진영 간 분절과 블록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략적 연계성까지 고려한 입체적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중 협력 역시 우호적 교류에서 벗어나 더욱 정교하고 유연한 실용 협력의 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이전보다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양국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윈윈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양국이 경쟁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상호 보완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중국은 시장과 자본, 인재의 기반이 탄탄하고, 한국은 정밀 공정, 시스템 설계, 빠른 상용화 능력 등의 강점이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특성을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신뢰’이다. 떨어질 수 없는 이웃관계에서 사소한 애증관계를 넘어 미래를 향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기술이 국력이고, 과학은 외교이며, 혁신은 미래다. 변화의 파고를 넘어설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균형, 현실감각, 전략적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 이진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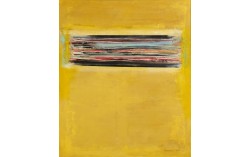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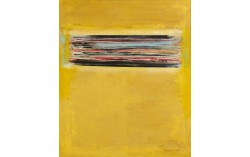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