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지친 당신에게 내민 손,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자고
-
4회 연결
본문

권누리 시인은 2019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지난달 25일 출간된 권누리(30) 시인의 시집 『오늘부터 영원히 생일』(문학동네·아래 사진)의 제목은 이런 시구 중에 등장한다. “한여름이 정수리에 쏟아진다/투명하게 빛나는 손바닥/오늘부터 영원히 생일을 축하받고 싶다…”( ‘오래된 섬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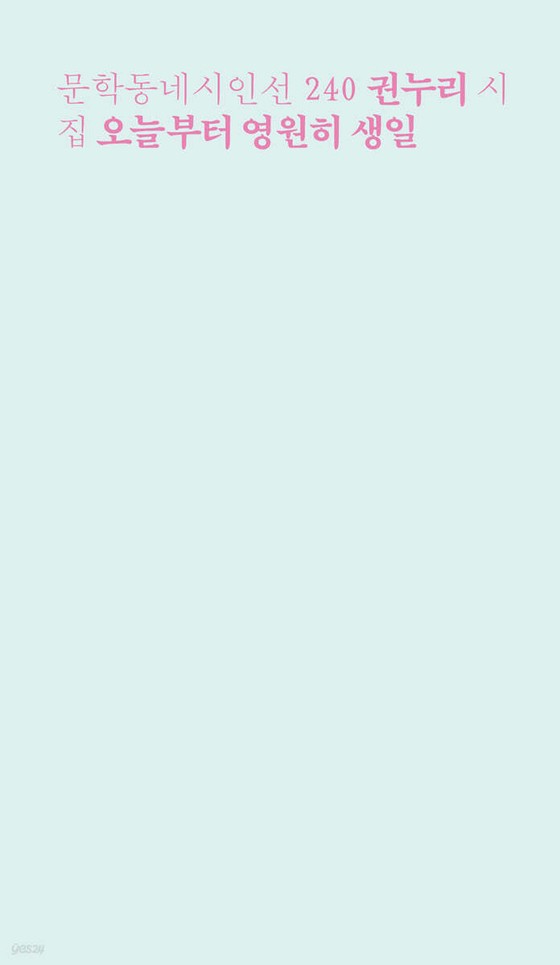
권누리의 시는 세상에 만연한 ‘모순’을 다룬다. 생일도 예외는 없다.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기쁜 날인 것처럼, 누군가에겐 두렵고 외로운 날일 수 있다. 시 속 화자는 생일을 “축하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환대를 받은 경험은 “너무 오래됐”다고 털어놓는다.
그의 첫 시집 『한여름 손잡기』(2022, 봄날의책)는 총 10쇄를 기록하며 약 1만명의 독자를 만났다. 신인 시인의 시집으로 드문 기록이다. 두 번째 시집 출간을 기념해 지난달 27일 만난 그는 “북토크나 후기를 통해 만난 독자들이 ‘함께 읽고 싶어 이 책을 주변에 선물했다’거나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설명할 때 ‘나의 손을 잡아주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첫 시집에서 자신의 퀴어 정체성을 들여다봤다면, 두 번째 시집은 또 다른 정체성들에 대해 썼다. 고향 대구에 관한 이야기나, 청소년기를 다룬 시도 있다. 더욱 견고해진 것이 있다면 ‘모순’을 바라보는 태도다.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른 쪽에선) 동시에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감정들이 이어져 있다고 느껴요.”
시인의 세계에서 죽음과 삶, 기쁨과 슬픔은 양면색종이처럼 붙어있다. 아픔을 담은 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가 있다면, 시를 통해 이렇게 전하고 싶다. 어떻게든 같이 살자. 더 산다고 삶이 바뀌진 않지만, 살아지긴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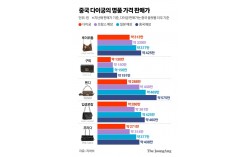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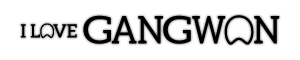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