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뷰] ‘쿵’ 죽음의 벽 너머 삶을 묻다…연극 ‘엔드 월’
-
5회 연결
본문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깊은 침묵에서 마주하는 건 누구일까. 사후에도 마음속 가장 소중한 기억은 어딘가에서 맑은 구슬처럼 빛날 수 있을까.
제2회 서울희곡상 수상작 ‘엔드 월(End Wall)’은 23세 청년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인생을 돌이켜보며 당시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넘어갔던 사건의 의미를 반추하는 방식으로 극을 전개한다.
연극으로 태어난 평택항 사망 사고

일용직 노동자 아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등학교 동창들. 모두 함께 오키나와로 여행가는 꿈을 꾼다. 문희철 기자
막이 열리면 무대 정중앙에 거대하고 녹슨 개방형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2021년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건을 극화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4개의 벽체 중 길이가 긴 면을 ‘사이드 월(Side Wall)’이라고 부르고, 길이가 짧은 면을 ‘엔드 월’이라고 부른다. 이씨는 연극의 제목이기도 한 300kg 무게의 엔드 월에 깔려 2021년 4월 22일 숨을 거뒀다.
자신의 죽었던 장소에서 시간이 멈춘 일용직 노동자 아성은 사후에 만난 또 다른 일용직 노동자 무명과 함께 평택당진항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린다. 아성과 무명은 서로에게 “숨이 멎을 때 네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 그게 뭐야?”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이 과정에서 산업 재해가 만연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폐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2회 서울희곡상 수상작 ‘엔드 월(End Wall).’ 문희철 기자
예컨대 극 중에선 작업반장이 눈에 보이는 일용직에게 즉흥적으로 나무나 줍고 가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실제로 사망한 이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는 본인 일이 아닌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극 중에서 아성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엔드 월에서 고정핀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씨 역시 안전 장비 없이 현장에서 변을 당했고,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군데군데 드러나는 노동 현장의 이주 노동자 멸시·혐오나, 하청·재하청 문제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극 중 등장하는 사할린 이주 노동자 고래는 계속해서 “그건 우리 일 아니다”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우린 이곳에서 나무토막 같은 존재였네요.”
서울희곡상 수상…하수민 연출

시간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한 무대. 배우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도 열을 식혀줄 눈이 내린다’고 독백한다. 문희철 기자
부조리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아성은 “벽 너머에 뭐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라고 말한다. 아성과 같은 일용직 노동자에게 노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성은 평택항에서 노동하면서 돈을 모아 고등학교 친구들과 오키나와로 놀러 가고 싶었다. “그때마다 나는 저 벽 너머를 봤어.”
아성에게 엔드 월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가 아니었다. 삶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육중한 벽이자, 그 너머에 존재할 미지의 희망과 자유였다. 23세, 가장 눈부실 나이에 생을 마친 아성은 결국 오키나와 해변의 투명한 파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 하지만 언제나 왁자지껄한 친구들의 웃음소리만으로 그의 마음은 파도쳤다. “소리는 기억의 방아쇠야. 기억하면 소리가 들려.”

엔드 월 커튼 콜 행사에서 모든 배우들이 등장해 박수갈채에 화답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우리는 모두 각자 엔드 월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어떤 이에겐 타고난 가난이, 어떤 이에겐 뿌리 깊은 차별이, 어떤 이에겐 꿈을 짓누르는 현실이 엔드 월이다. 이따금 새벽 출근길 이슬에서 노동의 숭고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우리는 이내 거대한 엔드 월에 갇힌 자신을 발견한다.
고단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있을까. 반복하는 노동에 압도당해 벽 너머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쿵.’ 23세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을 불러온 거대한 엔드 월이 무너지는 소리. 연극에서 재현한 이 소리는 각자 자신만의 벽 앞에 서 있는 관객들에게 묵직함 울림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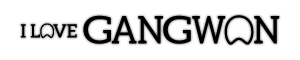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