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중국이라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은 애플의 고민과 난제[BOOK]
-
6회 연결
본문

책표지
애플 인 차이나
패트릭 맥기 지음
이준걸 옮김
인플루엔셜
‘중국에서 윈윈(win-win)이라 하면 중국이 두 번 다 이긴다는 뜻이다’라는 우스갯말이 있다. 자사 제품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과 중국은 상생하는 윈윈 관계일까, 아니면 중국만이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되는 관계일까.
패트릭 맥기가 지은 『애플 인 차이나』는 애플과 중국의 미래 관계를 점쳐 볼 수 있는 예리한 통찰을 담고 있다. 지은이는 장기간의 심층취재를 바탕으로 수많은 애플 내외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최고경영진의 이메일과 비공개 자료 등을 총동원해 ‘중국에 완전히 포획된’ 애플의 현 좌표를 정밀 분석했다.
애플은 1999년 중국에 위탁생산업체 폭스콘을 두고 있는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과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고, 애플의 강점인 ‘제약 없는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폭스콘은 탁월한 생산 기술 습득력과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애플의 중국 진출을 촉진하고 결국엔 애플을 만리장성의 늪에 빠지게 한 징검다리가 됐다. 중국이 애플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애플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들어가 기술력을 전수해 준 것이다.
중국은 현재 애플이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다. 럭스셰어, BYD 일렉트로닉, 고어텍, 윙텍 등 4개 회사는 중국 붉은 공급망 ‘빅4’로 불린다. 애플은 기존 대만 업체들인 폭스콘, 콴타, 페가트론, 위스트론에서 이들 중국 업체로 주문을 이전하고 있다. 애플의 전폭적 지원 아래 더욱 정교해진 중국의 붉은 공급망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20년 이상 축적된 제조 생태계 전반이다.
계란을 중국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은 애플은 뒤늦게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난제 중 난제다. 중국은 애플의 다변화 시도를 언제든지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행보는 미·중 양국뿐 아니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중국 늪에 빠진 애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로 안성맞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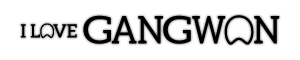
댓글목록 0